
■ 강혁 '경계속의 시간'
■ 기간 : 2007. 12. 22 (토) - 12. 28 (금)
■ 장소 : 스페이스 빔 우각홀
■ 오픈 : 2007. 12. 12 pm 6:00
1. 사물은 공간에 존재한다.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부피를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점유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허용의 주체는 시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연이든 필연이든 사람과 사물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그 찰나의 경계 속에 시간은 주의 깊게 살핀다면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주체로 존재한다는 것과 존재하는 것 사이에 있는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연구로부터 작가 강혁의 작업은 시작된다.
2. 하이데거는 자신이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는 자각을 하는 인간만이 미래를 향한 의지를 발현하고 이로부터 자기 자신의 과거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고 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이라는 미래의 시점에 의해 자신의 과거가 의미 있는 것으로 반복된다는 것이다.
과거란 단지 이전의 객관적 시점에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고, 미래도 객관적 시점에 미리 있는 게 아니라 저쪽으로부터 이쪽을 향해 다가와 도래하는 무엇이다. 따라서 현재란 어떤 하나의 물리적 지점이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 된다. 결국 시간은 인간의 삶의 방식 그 자체가 산출하기에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시간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돌덩이는 존재 그 자체와 존재하는 것 사이에 별반 갈라진 틈새가 없지만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성인 채 살아간다. 그로부터 인간은 존재 그 자체를 이해하는, 아니 이해하려 노력하는 세계 속 하나의 특이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작가 강혁이 존재하는 것으로의 시간이 아니라 시간의 존재 그 자체,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만만치 않은 화두를 택한 이유라 할 수 있다.
3. 하지만 역사적 주체 중심의 시간은 아무래도 선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작가 강혁이 드러내는 시간은 층류적 시간과는 다른 난류적 시간이다. 과거에서 미래로만 흐르는 시간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조금 우회할 필요가 있다.
죽음이란 단순한 사라짐, 혹은 텅 빔의 무가 아니라 소유할 수 없는 신비이다. 고독화된 순간의 단조로움과 똑딱거리는 시계소리를 깨뜨릴 수 있는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다른 것, 미래, 시간의 시간성의 발생 가능성이다. 그래서 작가 강혁의 작업은 동일자가 타자 속에 흡수되는 무아경이나 타자를 동일자로 귀속시키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없는 관계, 채울 수 없는 욕망, 가능한 것 너머의 가능성으로 달려간다. 레비나스의 말처럼 존재자 없는 존재, 익명적 존재 사건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그런데 존재자 없는 존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모든 사물과 사람이 무로 돌아가면 순수한 무를 만나는가. 상상 가운데 모든 사물과 사람을 파괴해보자. 그러면 그 뒤에 남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있다’라는 사실뿐이다. 모든 사물의 부재는 하나의 현존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장소로, 대기의 밀도로, 텅 빔의 가득 참으로, 침묵의 중얼거림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 스스로 부과하는 존재함의 사실, 이제 그것은 익명적이다. 그러므로 작가 강혁이 감각적 직관으로 잡아내 보여주는 시각이미지는 소통의 도구라기보다는 자기 확인의 기회로써 그 의미가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4. 자기 확인은 언제나 현재적이고, 과거에 달라붙어 있는 현재는 모두 과거의 유산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 근거 위에서 현재인가. 현재의 시점에서 미래도 미래의 시점에서 보면 현재다. 그렇게 본다면 과거 또한 현재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하나이며 동시에 별개이다. 그것이 작가 강혁의 작업에서 시각적으로 드러나는 선적이고 역사적인 시간과 유클리드적 공간이 사라지는 이유다. 그의 경계 속 시간은 융합된 시간으로 새로운 살이를 위해 살아 오른다.
지속하는 것은 언제나 동일한 현재이거나 동일한 과거이므로, 혹은 동일한 미래이므로 시간은 어디서도 시작하지 않는다. 멀어지는 것도 없고, 흐릿해지는 것도 없다. 밖에서 들리는 잡음만이 잠들고 있지 않음을 알려줄 뿐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도무지 빠져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너머에서 새로운 시작을 이끄는 것은 밖으로부터 유래한 안개뿐이다. 이것이 바로 작가 강혁의 작업이 뚜렷한 개시성으로서가 아니라 유령처럼 스미듯 다가서는 이유이다.
5. 스치듯 만나는 경계 속의 시간, 융합된 시간은 이제 선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 어떤 계획을 따라 흐르지도 않는다. 시간은 굉장히 복잡하고, 예기치 않게, 다양성을 따라 흐른다. 다시 말하자면 작가 강혁의 시간은 멈추는 지점들, 단절들, 구덩이들, 놀라운 가속도를 만들어내는 장치들, 균열들, 공백들, 우연히 씨 뿌려진 전체 등을 가시적인 무질서 속에서 보여준다.
이번 개인전의 작업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여러 장면을 중첩하여 보여주는 이미지들은 단절의 공간을 통해 성립된다.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의 맥락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공간을 평면에 담는다는 것은 펼쳐진 시간에서 어떤 특정 부분을 끊어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제 작가 강혁의 시간은 접혀지고, 비틀리며, 지나가기도 하고 지나가지 않기도 한다.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과된다. 하지만 기존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허약해 뵈는 이런 사태를 통해 인간은 진보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복자들의 시간처럼 보이고, 그들에게 피정복자들을 짓밟을 거의 자연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다윈의 시간조차도 실수들에 의해 움직인다. 따라서 기존의 의식과 인식론을 버리고 다시 존재의 국면을 찾아 나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6. 현실과 확장된 현실을 넘어 신의 영역에 다다른다 해도 거기에 공간이나 존재 따위는 아예 없을 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하나의 헛된 망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런 경계 속의 시간을 만난다 해도 다가올 세계를 미리 앞당겨 현재에 표현해 보이려는 노력을 그만둘 수는 없다. 작가 강혁의 제시하고 있는 미술 프로젝트는 승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문제 제기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실패와 회복을 통해서 진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길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길이 발견과 발굴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박황재형(작가, 시각이미지 비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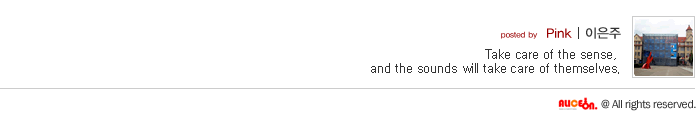
'live! > art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New Folder-Drag Video_이용백 영상.설치展 (0) | 2008.01.03 |
|---|---|
| mit communications forum _spring 2008 program (0) | 2008.01.03 |
| coffe with sugar - 터키전 (0) | 2007.12.28 |
| sk-interfaces_in UK (0) | 2007.12.23 |
| Digital Mirror (0) | 2007.12.23 |
| 어머니와 딸 & 에로티시즘 21c (0) | 2007.12.20 |
| 앨리스온 tv 18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 | 2007.12.20 |
| “모바일 해킹 워크샵 Mobile Hacking Workshop” (0) | 2007.12.14 |
| 상하이 e-Arts festival (0) | 2007.12.13 |
| 앨리스온TV 17회 방송 안내. (0) | 2007.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