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 you go away, 람다 프린트lambda print, 110×150cm, 2008
일시: 2008년 5월 1일 ~5월 30일
장소: 갤러리 잔다리
홈페이지: www.zandari.com
바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싶어하고 찾아온다. 일상에서 답답함을 느낄 때, 조금 다른 일탈을 원할 때 ‘그냥’ 생각나는 것이 바다란다. 아마도 하늘과 맞닿아 있는 푸른 수평선을 그리고 자신에게로 끊임없이 밀려들어오고 나가는 파도를 바라보며 자기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자신이 아닌 바다에게 귀를 기울이는 이가 있다. 그는 늘 한 곳에서 늦은 시각 바다와 만나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태양과 함께 뜨고 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 수없이 많고 다른 바다의 이야기에 ‘파랑’이라는 운율을 담아가는 이다. 그는 어둠 속에서 그 속 깊은 파랑을 수 없이 끄집어 내고 바다를 비추고 있는 은은한 달빛에 비친 바다의 창백한 파랑까지 고집스레 담아가기를 끊임 없이 반복하는 이다.
작가라 불린다
작가들은 프레임에 담긴 이미지가 이야기 하도록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작가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그에 더해 글 쓰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언어로 너무나 많이 떠들면 관객은 이미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가끔은 그도 그들의 목소리에 지칠 때가 있다. 그는 말하지 않고 그가 들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고 그가 경험한 그 파랑의 운율과 힘을 전해주고 싶다. 그가 만나는 바다는 시시각각 변하고 늘 새로운 이야기로 그를 부른다. 깊은 밤 바다와 마주해 본 적이 있는가? 깊은 밤 어둠 속에서, 침묵 속에서 마주하고 있던 먹 빛 하늘과 바다 아래에서 짙은 파랑을 만나게 됨과 동시에 셔터는 찰칵 소리를 내고 그가 만난 파랑이 필름과 만난다. 그의 눈 앞의 파란(波瀾)은 마치 시간 속 기억 속 저 아래에 침잠해 있다 떠오르는 기억의 이미지들처럼 그에게 끊임없이 밀려왔다 밀려나간다.

If you go away, 람다 프린트lambda print, 110×150cm, 2008
그의 이름은 파랑
그의 이름은 파랑이다. 어떤 이들은 바다라고도 부르지만, 그는 파랑이라고 불리우기를 원한다. 그의 시각과 감각으로 얻어진 얼핏 모두 같은 듯 하지만 어느 하나도 같은 것이 없는 파랑과 파도, 하늘과 수평선, 달과 바다는 모두 파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잔잔한 운율을 만들어 보는 이로 하여금 조용한 리듬을 타게 한다. 그는 그와 마주선 당신이 그가 어느 날 어느 깊은 밤 만났던 짙은 파랑을 느끼고, 자신의 파란 하늘과 파도에 비친 당신의 푸른 그림자와 함께 손을 잡고 그가 만든 프레임 속에 더 없는 파랑을 만들어 볼 것을 권한다.
Bluest BLUE, 지금 만나러 갑니다.
기획자들은 많은 작가들과 작품을 만나고 전시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어 놓는다. 다양한 작품들과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즐겁기도 하지만, 많은 작품들과 전시, 이를 소개하는 매체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현학적인 글들에 치이고, 때로는 본인의 글에도 남들도 다 쓰는 철학용어 한 두 개쯤 넣지 않아 빈약해 보이는 것은 아닌지 살짝 고민도 해 본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작품이나 전시 자체보다는 그를 포장한 글들을 쏟아내고는 그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기도 하는 것이 필자의 모습이다. 각종 이론과 담론이 무성한 시대에 살면서 소망한다! 아무런 말도 필요 없는 어떤 글도 생각나지 않는, 그 앞에서는 벙어리가, 귀머거리가 되는 그런 작품을 만나고 싶다고… 앞에 놓인 작품 그 하나가 나를 감싸고 내 마음을 움직여 그 속으로 뛰어들고픈 충동을 일으키는 ‘그냥’ 좋은 그런 작품! 지금, 만나러 갑니다.

『Bluest BLUE』展 갤러리 잔다리전시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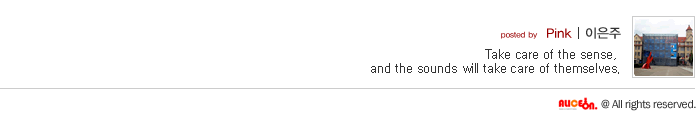
'live! > art & news'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니엘리 Daniel Lee 개인전 (0) | 2008.06.05 |
|---|---|
| 달 아래 이카루스 Icarus under the moon _박진호 개인전 (2) | 2008.06.04 |
| The MEATRIX & 환경영화제 아카이브 (0) | 2008.05.22 |
| 양정아展 (0) | 2008.05.22 |
| 미디어철학_프랑크 하르트만 (0) | 2008.05.22 |
| 홍성민개인전 'Revolving Sashimi: 먹어도 좋다는 신호 (0) | 2008.05.13 |
| eyebeam 자선파티_Freedom and Creativity (0) | 2008.05.09 |
| SeMA2008 : 미술을 바라보는 네 가지 방식 (0) | 2008.05.08 |
| on the Blue Territory_금혜원전_덕원갤러리 (0) | 2008.05.08 |
| 서울디지털포럼2008 (1) | 2008.05.08 |